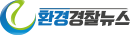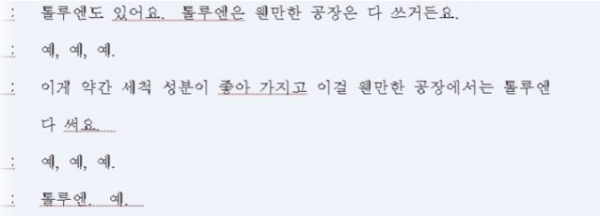
16일부터 새로 개정된 산업안전보건법이 시행됐다. 이 법은 태안화력발전소 비정규직 일용직 근로자였던 故김용균 씨의 애석한 죽음을 기려 '김용균'법이라고 이름을 붙였다.
그러나 이 법이 시행됐다고 해서 우리나라 근로자의 안전 문제를 보장하지 않는다.
특히 뇌 심혈관계 질 환자들의 산재인정 문제는 전혀 개선된 바 없다. 화학물질을 취급하는 근로자들이 질병 판정을 받으려면 작업장에서 사용하는 유해화학물질정보(MDSD)가 원칙상 공개돼야 한다.
그러나 우리나라 법은 애석하게도 작업장에서 영업비밀로 하는 물질정보에 대해서 비밀보장을 약속해주고 있다. 그 바람에 근로자가 병에 걸려 죽는다 해도 외면하는 법이 돼버렸다.
국가 경제 수출 품목 1위가 석유 화학 공업 산업이다. 이 말인 즉, 국민의 목숨을 담보로 일 군 국가경제 성장을 의미한다.
뇌심혈관계 질병환자들은 100% 대놓고 산재가 거부되고 있다. 모두 의문사로 처리됐다. 연평균 산재 승인율 0%라는 놀라운 기록을 세우고 있다. 이래도 산업안전이 보장되는 나라라고 말할 수 있을까.
이제는 공장에서 취급하는 독성 화학물질들이 가정으로까지 흘러 들어갔다. 가습기 살균제 살인사건이 대표적 예다.
국민이 죽어야 기업이 산다.
2011년 기준, 실생활에 노출된 독성 화학물질 수만 6만 4천 종이다. 국민 중 1/3은 잠재적인 암 환자로 분류되고 있다.
1996년 조선술의 전통적 주류 제조시설부터 시작해서 타이어와 반도체 산업 등이 세워지기까지 수많은 근로자들이 병에 걸려 목숨을 잃었다.
현재 개정된 산업안전보건법 만으로는 근로자들의 죽음의 향연을 막기에는 불가항력이다.
'암에 걸릴 위험을 알고도 일할 근로자가 몇이나 있을까' 현 국회가 곱씹어봐야 한다.
지금에 법무부 장관인 추미애 조차도 죽음의 공장이라고 불리는 한국타이어 작업장 앞에서는 두려워했다.
2008년 산업안전보건공단의 한국타이어 작업장 역학조사가 있던 당시 환경노동위원회 국회 상임위 위원장이었던 추미애 장관은 공장 문턱도 밟아보지 않고, 발길을 돌렸다.
본인 조차도 거리껴지는 작업 환경에서 일했을 근로자들은 어땠을 까. 생각은 해봤는 지 의문이다.
우리나라 산업현장에서 근로자는 위험한 일을 해주는 대신, 돈을 받고 일하는 시종쯤으로 취급되고 있다.
이를 바로 잡지 않는 이상, 산업안전보건법의 존재의 의미가 있을까 싶다.
환경경찰뉴스 조희경 기자